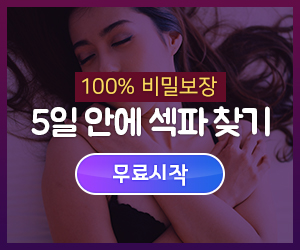色魂 無影客! - 1부 10장
본문
흑립 사이로 들어난 설 무영의 눈빛이 번쩍였다. 죽어 넘어진 사람보다 그를 둘러싼 사람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적어도 이백은 넘으리라. 한쪽에서는 개방의 지원군이 도착하여 혈투를 버리고 있다.
"간 다~! 길을 비켜라!"
설 무영이 내지르는 사자후(獅子吼)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귀청을 울렸다.
"으으으.......!!"
내공이 실린 설 무영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귀청을 찢어질 듯하였다. 천년의 내공이 있는 뇌광이었다. 설 무영의 우레와 같은 소리는 견딜 수 있다. 허지만 그도 한쪽 다리에 짙은 검흔이 있었다.
"대단하다……! 그럴수록 살려둘 수 없다. 존의 앞길을 위해서도.......철마척살대(鐵魔拓殺隊)는 반드시 저놈을 죽여야 한다!"
뇌광의 음산한 말을 듣는 설 무영의 뇌리에는 갖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존이라 했던가? 저들의 철마척살대는 무엇이고?" 그는 뇌광의 말을 되새기며 한걸음 나섰다.
"철마척혼진을 가동하라!"
뇌광의 한마디 구령에 설 무영의 주변으로 척살대 인원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삼삼오오 작은 원진을 만들고 작은 원진이 설 무영을 중심으로 오행을 이루며 또 다른 원진이 돌아갔다. 그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었다. 원진에서 나오는 마기가 악랄하고 그 위세가 땅을 뒤집을 자세였다.
(오냐! 속전속결뿐이 없다.......!)
설 무영이 스르르! 묵검을 빼들었다. 좌측 손을 검 대신 우측에 묵검을 들고 척설대의 철마척혼진 안으로 뛰어 들었다. 그의 좌수에서도 검강이 일어난다.
"검즉아(劍卽我), 아즉검(我卽劍). 검이 내 몸이요. 내 몸이 검이다"
뇌광은 철마척혼진 안으로 뛰어드는 설 무영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철마척혼진이 어떻한 것이냐? 일개 종파의 본거지를 폐허로 만든 천마성 정예부대의 마혼진이 아닌가? 그런데 혈혈단신 뛰어드는 것을 보고 동귀어진(同歸於盡)하려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무공이 높아도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천상무신이 환신이라도 한 것인가?
그런데 보라!
그가 철마척혼진 위를 나르고 있다. 아니 진(陳) 위에 흑화(黑花)가 피어 있다고 할까.
"쑤아악..! 쎄에엑..!"
흑빛 검막(劍幕)은 좌충우돌(左衝右突) 척살대를 휘감을 듯 쇄도해 들어갔다. 그러나 실제 설 무영은 혼신을 다하고 있다. 공격은 곧 방어이고, 방어는 곧 공격이다. 동으로 치는 척하며 서를 공략하고 남을 치는 척 하며 북을 친다. 한 식경이 흐르고 그에 의해 철마척혼진은 무너져 갔다.
"으 악~! 아 윽…! 케 액......! "
흑무가 닿는 곳의 검강에 비명과 함께 죽어 넘어가는 자가 부지기수다.
검(劍) ,도(刀) ,장(掌)이 난무하는 혈전(血戰).
허지만, 살상을 해도 척살대 숫자는 줄지 않는다. 죽여도, 죽여도 척살대는 개미 때처럼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도대체 이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모른다. 옷이 갈래갈래 찢긴 설 무영도 온몸에 상처투성이다. 핏빛으로 물든 그도 인간! 지처가고 있었다.
"으 헉~! 지옥…사자다.......!"
"으~엑!"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피로 하천을 이루었다. 또 다시 한식경, 이젠 설 무영의 기도가 쇄진해 가고 있다. 강호에 출도하고 그로서는 처음으로 겪는 집단과의 혈전이었다. 어림잡아 일백 오십 여명 이상은 그의 손에 죽었다. 극쾌 극강의 흑강만으로 그는 혈혈단신 인산인해의 도검이 척살해 오는 바다를 헤엄쳐 나가고 있는 것이다.
"헉~!"
혈무(血霧)로 쌓인 그의 우측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화살이 박힌 그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다. 그는 피바다를 이룬 척살대 위를 걸어가듯이 뛰어 넘었다. 안개처럼 흘러간 그의 모습이 척살대를 벗어나 십여 장을 날아갔다. 설 무영은 고진감래(苦盡甘來) 끝에 개방 감축분타를 벗어나 맥적산 기슭으로 왔다.
"휘~휙! 휘휘…획!"
그러나 숲속에서 또 다른 척살대가 튀어 나왔다. 어느새 그는 다시 척살대에 둘러싸였다.
"사화탄대(四火彈隊)는 우측, 오금철대(五金鐵隊)는 좌측을 막아라!"
설 무영은 연이어 검강을 일으키며 소리 나는 곳을 보았다. 척살대의 두령인가. 그때, 메케한 냄새와 함께.
"콰콰쾅....!"
천지개벽(天地開闢), 그의 발밑에서 지천을 흔드는 폭음 속에 앙천대소가 들려왔다.
"하하하.......! 죽어라!"
그들이 설 무영의 발밑에 터트린 것은 벽력광천뢰(霹靂 天雷).
"콰~르르! 콰~쾅.......!"
연이어 터지는 폭음. 그가 발 디딜 곳이 없었다.
(아뿔싸~!)
설 무영의 등에 진땀이 흐른다. 전(前) ,우(右) , 좌(左)가 척살대의 검과 도가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내려서자니 벽력광천뢰(霹靂 天雷)에 의해 풍지박살 된다. 후면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도록 까마득한 낭떠러지,
망혼애(忘魂崖)의 계곡이 그를 향해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 얼굴에는 땀과 피가 범벅이 되어 흐르고 있다. 피로 범벅이 되어 만신창이 된 그의 모습은 마치 피에 굶주린 야차(夜叉) 같았다.
일촉측발(一觸卽發)! 벽력광천뢰에 폭사 아니면 척살대의 도검에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망혼애(忘魂崖)에 운명을 맡길 것인가? 생사의 기로(岐路)에서 운명은 찰나의 선택에 달렸다.
휘…익!
그는 하늘에 운명을 걸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망혼애(忘魂崖) 아래로 몸을 던졌다.
콰쾅...! 쾅! 우르르....!
벽력광천뢰의 폭음과 뿌연 먼지와 함께 그 끝도 보이지 않는 망혼애 아래로 바윗돌이 부서져 내렸다. 아울러 바위조각들과 함께 설 무영의 몸이 까마득하게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
척살대의 수장들이 우르르 단애위에 모여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침묵, 그 누구도 말이 없다. 단지 단애 아래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그들의 도포를 휘날렸다. 개방분타를 멸살했지만 한 사람을 척살하기 위한 혈투는 지옥이었다. 그들에게도 지겨운 혈투였다.
과연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도 크단 말인가! 강호에도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 과연 그는 누구였단 말인가? 그들은 넋을 잃고 망혼애(忘魂崖)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하나, 둘 사라져 갔다.
하늘은 과연 그를 버렸는가?
이제 그의 운명 같은 한을 풀기도 전에 선조와 같이 그의 혼도 구중(九重)을 떠돌아야 하는가? 설무영의 몸을 삼킨 망혼애는 고고한 바람결에 적막이 흐른다. 이후로 강호 무림인은 그를 흑풍야차(黑風夜叉)라고 하였다. 그의 일당천(一黨天)의 용기와 혈투를 기리는 사람들은 흑풍영존(黑風影尊)이라고도 하였다.
척살대가 돌아가고 한 식경이 지난 망혼애(忘魂崖)의 천길 밑바닥. 아무도 그곳에서 생명체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스믈~! 스믈~!
그곳은 음산한 안개가 깔린 습지였다. 독충과 독초가 뒤엉켜 있다.
"으…! 으~으윽........!"
그 스산한 안개 속에서 미약한 신음 소리가 흘러 나왔다. 검은 물체가 꿈틀거렸다. 잠시 후 검은 물체는 돌밭을 기어가기 시작했다.
"주, 죽으면....... 안 돼.........! 크윽!"
안면을 찡그린 채 고통에 신음하는 그 묵인의 형색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머리와 의복은 불에 그슬린 듯 시커멓고, 너덜너덜 찢긴 옷은 넝마처럼 몸을 감싸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온몸은 상처에서 나온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묵인은 엄습해 오는 고통에 혼절을 하였다.
그리고 반 식경이 지나 다시 정신을 차린 묵인은 앞으로 기어갔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나.......! 난! 살아야.......살아야.........돼......!"
버러지와 다를 바 없는 생명의 끈질김이었다.
"으으으......."
묵인은 고통에 못 이겨 쓸어졌다가는 다시 기어가고, 그러하기를 몇 번인가, 묵인이 다다른 곳은 작은 샘터였다. 묵인은 샘터에 엎드려 벌컥 벌컥 샘물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혼절한다. 한 식경 후, 묵인은 홀연히 일어나 앉았다.
(내가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지......! 여기가 어디지?)
설 무영!
천지현동(天地玄洞)에서 출관한 강호 초년생(江湖初年生)!
강호경험이 없어 혈기로만 혈혈단신 철마척살대(鐵魔拓殺隊)를 상대하다가 벽력광천뢰(霹靂鑛天雷)를 피해 맥적산(麥積山)의 까마득한 단애 망혼애(忘魂崖)로 몸을 던진 그였다.
설 무영은 바위에 기대 앉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짙은 안무가 가득한 위쪽으로 까마득하게 망혼애(忘魂崖)의 끝부분이 올려다보였다. 그 끝은 마치 하늘 위까지 뻗쳐있는 듯하였다. 설 무영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천기조원(天氣朝元)의 지체이기에 목숨을 부지 할 수 있었다. 그 뿐이랴!
그가 갈증으로 마신 샘물은 용천수(龍天水)!
용이 되기 위해 이무기가 천년을 찾아다니며 마셨다는 전설의 물이 아닌가? 공청석유와도 같은 또 다른 성수(聖水). 세인이 마시면 만병통치이고, 무인이 마시면 몇 백 년의 내공을 얻는다는 천세의 물인 것이다. 용천수로 인하여 그의 상처는 말끔히 치료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 난, 살았다.......! 허지만........"
그는 다시 주위를 살펴보았다. 까마득한 단애, 짙은 암무가 깔린 절곡, 어느 곳도 이곳을 빠져 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득 가물가물한 그의 시야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동굴의 입구가 시커멓게 보였다.
"......!?"
설 무영은 몸을 일으켜 앞으로 나아갔다. 동굴 입구는 일장이 넘는 기형기초가 엉켜 있었다. 미지의 세월을 지나며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식물들은 마치 방벽(防壁)을 이루듯 동굴입구를 막고 있었다.
스스스.....펑!
설 무영은 기형기초를 향해 일장을 내저었다. 입구를 막고 있었든 기형기초가 푸스스! 가루로 변해 떨어졌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동굴이 나타났다.
"이곳이 계곡을 빠져 나갈 수 있는 입구일까.......!?"
스스로 자문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동굴 밑에는 얕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가 무심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오는 발자국소리가 동굴 안에 반사되어 울렸다..
저벅....! 저벅.....!
종유석이 지면까지 늘어진 자연동굴이건만, 어딘가 오래전 인간의 숨결이 닿은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을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는 빛을 발하는 종유석 탓인지 동굴 안이 점점 밝아졌다. 동굴 안쪽으로 부터 흘러나오는 빛의 반사였다.
다시 일다경의 시각이 흐른 후, 빛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 그가 당도한 곳.
다섯 평 정도의 석실이 있었다. 빛은 석실의 천장에 박힌 야광주(夜光珠)에서 흘러 나왔던 것이다. 푸르스름한 야광주가 빛을 발하고 있는 석실, 장방형의 석실에는 어느 곳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
설 무영은 풀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결코 절망할 수는 없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
그는 사방을 주도면밀하게 살폈다. 인위적인 흔적이 보이건만 어디에도 출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온통 정제된 듯 화강암이 둘러싸인 석실 안은 오래된 짙푸른 이끼들만이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되돌아가서 단애를 오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가.......?‘
설 무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동굴 입구로 되돌아가는 방법뿐이 없었다.
투~툭!
무엇인가 발끝에 체이는 것이 있었다. 이끼가 잔뜩 낀 돌출부가 보였다.
"뭐지........!?"
이끼를 제거하고 나니 가죽으로 된 원통(圓筒)이었다. 잡아당겨 봐도 요지부동이었다.
".......!?"
그는 양손에 공력을 높여 힘껏 잡아 뽑았다.
크르르.....쾅!
그의 몸이 튕겨져 나가 벽면에 부딪쳤다. 원통(圓筒)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반탄강기에 의해 그의 몸이 튕겨 나간 것이었다. 설 무영을 튕겨낸 원통은 요지부동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오히려 신비로운 백색기류의 강기(剛氣)가 피어올라 원통을 보호하듯 주위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는 화강암 벽면의 이끼가 잔득 묻어났다.
"헛~!"
그는 흠칫 놀랬다. 이끼가 제거된 화강암 벽면에는 희미한 문자가 들어나는 것이다. 그는 급히 화강암 벽면의 이끼를 문질러 제거했다.
오! 그곳의 문자는 상고시대 문자이었다. 금문(金文).
석학(碩學)의 학자도 쉬이 풀 수 없는 문자인 것이다. 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고금기서(古今奇書)를 대했던 천지현관(天地玄關)의 두뇌(頭腦), 그가 풀지 못하는 문자가 있었던가? 금문은 갑골문(甲骨文) 이전의 문자. 그가 금문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나! 제갈운(諸葛雲)이 천운을 다하고 남긴다.
금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제(諸)…갈(葛)…운(雲)…! 제갈운…?"
설 무영은 격한 떨림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제갈운(諸葛雲)이라니?
그가 무림비연록을 통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한다면 이미 천 년 전에 중원은 물론 변황(邊荒), 남해(南海)까지를 통 털어 무림의 천(天)같은 존재 신검성황(神劍聖皇). 그 깊이를 모르는 무학과 아내에 대한 천고의 사랑으로 인해 당대무림 제일인을 꿈꾸는 절대자들에게 사라져갔던 하늘(天), 그 천존(天尊)이 이곳에 천수를 다했단 말인가?
이미 오래되어 색이 희미한 글씨지만 선명한 장문(長文)이 이어졌다.
이곳은 노부의 반려자 설미랑(渫美浪)와 함께 대청봉(大靑峰)에서 무림제일인자가 되려는 야망인들에게 무공을 폐하게 되고 삼십년을 더 삶을 유지 한 뒤에 적는 글이다. 이제 노부는 얼마의 생을 살아갈는지는 모르나, 무릇 무(武)의 길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 마음을 남긴다.
아직도 진정한 무도를 모른다. 하지만 노부의 무공을 전폐하게 한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자초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노부도 욕망을 갖은 인간일 수밖에 없었다. 무인(武人)도 불도를 수련하는 승려(僧侶)도 결국은 한 가지이다.
무인의 절대자의 무공에 대한 야망은 끝이 없듯이 중생을 구하려는 불도자의 불심 또한 그 끝이 없다. 무란 끝이 없는 마음(心)의 길이다. 이곳은 노부가 절대 절명 우연한 기연으로 알게 된 곳이었다. 이곳에 있는 상고기인(上高奇人) 천상무제(天上武帝)가 남긴 기보(奇寶)를 중심으로 노부가 무공을 창안하고 잠시나마 중원무림인의 존경을 받았었다.
무명동(無名洞)의 이곳을 노부가 사랑하는 내 처의 휘호를 따서 연화동(蓮花洞)이라 명명(命名)하였다. 절대무존(絶對武尊)을 지키기 위한 이 노부의 삶에 최후로 남은 것은 내처와의 애정(愛情)이었다.
노부와 처 사이에는 후손이 없었다. 우리 부부사이에 유일한 불행이라면 불행일수 있고, 부부의 정을 더욱 깊게 하는 결과라면 다행일수 있다. 하여 이곳을 폐하려다 후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몇 가지 안배를 하여 노부부의 유품을 남기기로 하였다.
인연이 있는 자가 이곳에 들었으면 하는 바이다. 인연이 없는 자는 기관(機關)을 강제로 작동시키지 않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만약 노부의 당부를 하잖게 생각하는 만용(蠻勇)은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 석실 안쪽은 맥적산(麥積山)밑이며 용암천이 흐르고 대청봉(大靑峰)에는 노부의 무공을 잃은 후 용암이 솟구쳐 만든 쌍암(雙岩)이 생성되었다. 기관이 작동되면 용암이 폭발하고 쌍암이 무너져 연화동은 영원히 패쇄 되도록 안배 되어 있음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노부가 터득한 무학의 이치는, 무도(武道)의 길은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글은 끝나고 있었다. 무학에 대한 심오한 뜻과 아내에 대한 지고한 사랑의 마음.
금문으로 쓴 것은 인연 있는 자를 기다리는 마음에서였으리라.
연화동의 비밀을 풀려고 중원무림의 절대고수들이 대청봉 쌍암을 파괴한 사건을 세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참여했던 무림인들은 쌍암 주변에 묻힌 기관에 의한 대폭발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었다.
세인들은 그 후 중원대륙을 휩쓸고 간 대홍수도 쌍암을 파괴한데에 대한 저주라고 생각했고, 쌍암의 전설을 진실로 믿게 되었던 것이다.
".......!"
설 무영은 글을 읽고 나서 쌍암에 대한 전설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무림인이면 누구나 절대자가 되고 푼 생각에 상고 비급을 얻고자 한다. 우연일까,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설 무영이 연화동에 올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도 기관이 열릴 수 있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너무도 철저한 안배에 의한 것이라 또 다른 천고기연(千古奇緣)이 아니면 연화동은 열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무도의 길을 들어선 설 무영에게는 신비롭기도 하지만, 그의 앞길에는 더욱 짙은 먹구름만을 품게 하는 글이었다.
"무한하다고......?"
신검성황(神劍聖皇)의 글을 읽고 난 설 무영의 마음은 더욱 답답하게 할 뿐이었다. 타인에 의해 무공을 전폐당하고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무인이 터득한 길이고 부인에 대한 애정만이 남았다는 무의(武意)는 정말 심후한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궁을 헤쳐 나가야하는 설 무영, 그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부모와 사부의 원한도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단 말인가. 최상무도(最上武道), 절대강자의 길은 묘연하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 길이 어디든, 가는 곳까지는 간다........)
설 무영의 증오와 복수로 똘똘 뭉쳐진 오기가 불같이 일어났다. 그의 삶이란 태어나는 자체가 오직 사무친 원한 때문이었다. 그의 두 눈에 신념과 결의가 격렬한 파문을 일으켰다. 뻗치는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석벽을 향해 쌍장을 휘둘렀다.
콰아아....쾅! 쿠르르....!
그의 분노를 대신하듯 석벽이 흔들리는 폭음과 함께 뿌연 먼지와 이끼가 쏟아져 내렸다.
"어떻게든 이곳을 나가자...!"
설 무영은 중얼거리며 동굴입구로 발걸음을 돌렸다.
"어.......!?"
몸을 돌리던 그의 시야에 또 다른 석벽에 문자가 나타나 있었다. 그의 쌍장에 의해 이끼가 떨어진 화강암 벽에 나타난 또 다른 문자. 의구심을 갖은 설 무영이 다가갔다.
연화령환(蓮花令環) 지인(持人)에게
다른 벽에 써있는 첫 글.
"어라…!"
설 무영은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끼고 있는 반지가 연화령환이 아닌가? 침을 꼴깍! 삼킨 그의 시선이 석벽을 향했다. 또 다른 안배가 있었다.
인연이 있다면 아마도 노부의 처가(妻家) 연화성궁(蓮花星宮)의 후손이리라 믿는다. 후손이 아닌 자가 연화령환(蓮花令環)을 얻었다면 그 연화령환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설(渫)씨 성의 후손은 특이한 혈액을 갖고 있다. 그 혈액이 있어야 연화동의 문을 열수가 있다.
"어…! 그럼 내가 연화신후(蓮花神候) 설미랑(渫美浪)의 후손이란 말인가? 그럼 백골마인(白骨魔人) 설무혁(渫武赫) 선조 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연화령환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었나.......!"
설 무영의 머릿속에는 온갓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다급해진 설 무영의 시선이 다음글로 향했다.
설(渫)의 후손은 보아라!
노부의 흔적을 설의 후손에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른다. 어차피 노부는 한순간 연민으로 설의 후손이 노부의 글을 보았으면 하고 남긴 것이니 더 이상의 염려는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연화동의 문을 여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연화동의 문을 열려면 원통형의 용수갑(熔收匣)을 뽑아야 하고 용수갑을 뽑으면 연화동에 설치된 기관이 풀리며 문이 열린다. 연화동에 설치된 기관을 열어야 한다. 연화동의 기관은 용수갑(熔收匣)을 빼내야 풀린다. 용수갑을 강제로 파괴하면 기관이 자동으로 작동되며 대폭발로 연화동이 폐쇄된다.
용수갑을 빼내는 방법은 연화령환을 우수 중지에 끼고, 연화령환을 낀 우수에 피를 묻혀라. 그리고는 용수갑을 잡아 뽑아라. 반드시 우수 중지여야하고, 설가의 혈이어야 한다.
용수갑(熔收匣)은 연화동의 용암이 흐르는 용하(熔河)에서 사는 만년독각화망(萬年毒角火망)의 표피와 만년용해귀(萬年熔海龜) 표피로 만든 것이기에 어떠한 열화에도 견딜 수 있다.
단 천년 이상의 내공을 지닌 극양지기가 아니면 연화동의 문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 연화동의 문을 열었다 해도 절정의 극양지기가 아니면 용암동을 건널 수 없고, 노부의 평생 비급을 얻을 수 없으리라. 부디 설의 후손에 무혼의 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휴~우…!"
벽에 쓰인 글을 읽은 설 무영은 긴 숨을 토해냈다. 글씨 하나마다 심후한 기도가 서려 있었다. 아울러 사후를 대비하여 설치한 기관의 주도면밀함은 세밀한 것이었다. 이미 천원지기의 지체로 심후한 내공과 극양지기의 몸인 그이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19금]레드썬 사이트는 성인컨텐츠가 합법인 미주,일본,호주,유럽 등 한글 사용자들을 위한 성인 전용서비스이며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사이트는의 자료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작권,초상권에 위반되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