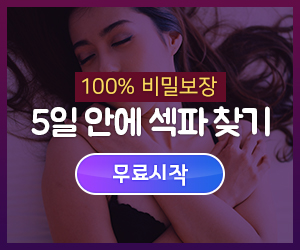내 젊은 날의 고해성사 - 13부
본문
사랑스런 상미.
어쩌면 상미는 항상 내 가슴 깊은 곳에
그래... 그곳에... 잠겨 있었는지도 모른다.
상미가 중학생일 때나 여고생일 때,
그때는 다섯 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은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녀석이 커가면서, 조금씩...
그렇게... 조금씩...
언제인가부터 내 가슴 깊은 곳에 들어와 있었다.
지독한 방황 끝에서
나를 꼬옥 껴안아줄 누군가가 못 견디게 그리울 때...
그 그리움의 대상이 누군지
....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나는
내 가슴 깊은 곳에 잠겨있던 상미를 꺼내곤 했다.
그 어린 녀석을 꺼내놓곤
내 스스로 어이없어 했다.
..
그러면서도 혹시
녀석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조마조마 했었다.
더욱이,
지난 3월에 녀석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만났을 때,
녀석이 늘씬한 숙녀로 바뀐 것을 보고서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
아아. 내 어머니 나라의 여자.
그래서 내가,
상미를 만나고 내려오자마자 서둘러 정희를 만났는지 모른다.
상미나 정희나 동갑이었다.
상미는...
그냥 상미의 나라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둘러 정희를 선택했을지 모른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상미에게 자신이 없었다.
아니, 자신이 없기보다는 두려웠을 것이다.
혹시라도 상미에게 부담스런 존재가 될 까봐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 정희를 만났지.
그러나, 정희는 내게서 달아나 버렸고...
그리고 나는 방황했다.
....... 그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던 것이다.
..
상미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가슴이 덜컹했던 까닭은 녀석에게 죄스러웠던 것이다.
녀석에게 모든 것을 들켜버린 것 같았다.
"우선 시내로 가서 저녁을 먹어야지?"
"그래, 오빠..."
우리는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녀석은 온갖 학교생활 얘기를 늘어놓았다.
객지에서 외로움을 탔을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신나서 떠들었다.
이게 녀석의 장점이었다.
항상 밝을 수 있는 재능...
언제나 상미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꿋꿋이 자라서 피는 들꽃처럼,
소담스럽고도 화사했다.
시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젊은 청춘들로 가득한 중앙통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때 속으로 나는 녀석이랑 어떻게 밤을 보내야 할까 하고 생각했다.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내 머리 속을 채우고 있었다.
...
..
"상미야! 너 어디 갈데 있어?"
"응? 어디 갈데? 왜?"
"...."
"오빠네 하숙집에 가면 되잖아.
나 안 재워 줄려고?"
...
"짜식이...
너 혹시 다른데 가려나했지 임마!"
"방 혼자 쓴다며?"
"... 그래,
알았어, 그러면 돼."
나는 상미가 어디 다른데 가기를 사실 바랬다.
아니 반대로, 솔직히 말하면...
설마 내가 상미를 어떻게 할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지내고 싶은 바램도 있었다.
다른데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관에 가야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녀석은 하숙집 얘기를 한 것이다.
손톱만치도 날 경계하지 않고 있었는데,
.... 나는 뭐야... 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 마음속 욕심을 녀석에게 들킨 것 같아서...
하긴 내가 "오빠는 음흉한 남자" 라고 고백을 해도
녀석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
하숙집.
안방의 미연이, 손 하사, 가 걸렸다.
그러나 나는, 밤이 더 늦기 전에 상미를 데리고 하숙집으로 갔다.
왜냐면 하숙집 아줌마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할 것 같았다.
하숙집으로 와서 아줌마에게 얘기를 했다.
시골 사촌 여동생이라고...
역시 안방의 미연이 신경 쓰였다.
그리고 손 하사,
손 하사를 겁탈한 방인데...
젠장.
상미에게 한없이 죄스러웠다.
갑자기 형언키 힘든 자괴지심이 들었다.
엄청난 죄를 범한 것 같았다.
...
녀석아...
한 달만이라도 일찍 좀 내려오지...
그럼 내가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녀석을 원망하고 있었다.
아니, 나를 한없이 질책하고 있었다.
자책하고 있었다.
"오빠! 뭐 츄리닝이라도 좀 줘, 입고 씻게"
그래서 걸려있던 체육복을 줬다.
"크~ 어휴 냄새... 오빤 입던 것밖에 없어?"
"짜식이..."
"사랑하는 동생이 온다고 했으면 뭔 준비를 해놔야지~잉?
돌아 서 있어 옷 갈아입게 좀!!"
상미는 세면장에 가서 씩씩하게 씻고 왔다.
하여간 거침이 없었다. 녀석은...
"너 이제 공부한 거 좀 얘기해봐 봐.
오빠가 얘기한 것도 있을 텐데?"
나는 마치, 자신의 죄를 철저히 숨긴 채
또 다른 흉계를 꾸미는 사기꾼처럼 금세 <칼릴 지브란>이 되었다.
..
"치,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지. 전혜린?"
"다 읽었어?"
"오빤, 참 내, 그 책 읽고 속상해서 혼났어,
그런 여자가 왜 자살해?
그것도 겨우 서른 두 살에? 어린 딸도 있고...
다 갖춘 여자가"
"그래서 아무런 교훈도 없었어?"
"골치만 아팠다 뭐, 그보다 오빠! 낼 어디 구경시켜줄 건데?"
"말 돌리지 마!"
"으~이그~~ 이 아저씨!! 이제 잘 거야.
아저씬 맨바닥에서 자. 알았지?
... 잔소리만 늘어 가지구..."
상미가 대학에 입학했으니
상미가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추천했었다.
내 스무 살 무렵에 나를 지배했던 책들.
전혜린의 수필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와
칼릴 지브란, 헤르만 헷세, 앙드레 지드 등등의 명작들을,
감성이 충만한 여대생이 되길 바라고...
나는 정말 녀석에게 <칼릴 지브란>처럼 굴었다.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마치 지브란이 <지아다>에게 보내는 것처럼,
<메리 헤스켈>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아주 고귀한 철학자로 포장했었다.
손 하사를 겁탈한 그 다음날에도 나는 아마,
상미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옷가게 윤경과 밤새 뒹굴고 돌아와서도 아마,
사랑하는 상미에게.... ,로 시작해서
밤에 잠을 설쳤더니 오빠는 머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랬을 것이다.
위선자.
이중인격자.
...
그 사이에 녀석은 피곤했던지 정말 이내 잠이 들었다.
나는 불을 끄고, 차츰 어둠이 익숙해지면서 보이는 녀석의 아름다운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고른 숨소리를 내면서 잠든 녀석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그래,
이 녀석의 이 잠든 <평화>는 언제까지나 내가 지켜줘야 할 텐데...
그렇게 다짐을 했다.
적어도 이 밤만큼이라도... 제발.
그러나...
내 가슴속은 평화롭지가 않았다.
...
<다음에 계속...>
[19금]레드썬 사이트는 성인컨텐츠가 합법인 미주,일본,호주,유럽 등 한글 사용자들을 위한 성인 전용서비스이며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사이트는의 자료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작권,초상권에 위반되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