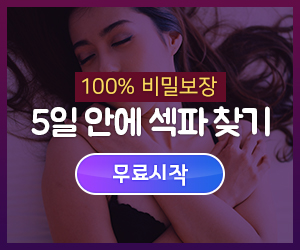● 산골에서 보내는 편지 - 프롤로그
본문
이 글은 야설이 아니 예요.
독자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자 한 것은 아니니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되요.
소설토론방에 올렸던 글을
저의 이름 밑에 한곳으로 모아두기 위해 소설게시판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소설게시판을 클릭한 초기화면에서 이 글의 제목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이 글 원래의 제목으로 수정하도록 할 깨요.
◐
게 시 방 : 소설토론방
게시번호 : 317.
제 목 : 산골에서 보내는 편지
작성자명 : 설앵초
조 회 : 439 (2004.07.13.16:00 현재)
작 성 일 : 2004-06-06 09:14:54
◐
● 산골에서 보내는 편지.
내 나이 넷인가 다섯인가 ?
하여튼…그 언저리 쯤에서…(아빠도 정확하게 기억하시지 못한다)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만지작거리며
굴뚝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낮잠을 잤는데.
오줌이 마려워 잠을 깨보니
내 곁엔
엄마가…없었어요.
아빠. 엄마 어디 가셨어.
응…엄마는…읍내 장에…우리 설이…과자 사려 갔단다.
아이∼신나라.
다음날 아빠는 싸리문 밖 널따란 공터에다
놀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주변의 흙을 모아 제법 높고 동그란 동산을 만들고
그 위에 부드러운 잔디도 입히고
산골의 아름다운 돌들을 주워서
동산 주위에 동그란 돌 울타리도 만들고
그 울타리 밖으로는
빙빙 돌아가면서 설앵초를 심어 주셨고요.
또 아빠는 그 동산에
굵직하고 줄곧은 상수리 나무 두 개를 잘라서 기둥을 세운 후
칡넝쿨을 꼬아 만든 줄로 그네도 만들고
작년에 비어 두었던 소나무를 짤라 얼기설기 칡넝쿨로 잡아매어
길다란 공원 의자도 만들어 주어 난 그 곳에서 낮잠을 자곤 했어요.
아빠와 난 매일 그 동산 앞에 놓아 둔
널따란 바위에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곤 했는데
아빠는 식사를 하시기 전에 언제나 밥 한술을 듬뿍 떠서 그 동산 위에 뿌리면서
혼자 말로 "많이 먹어" 하셨어요.
아빠. 누구한테 밥 주는 거야.
응. 토끼랑 다람쥐가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그럼 나도 줘야지.
토끼야 다람쥐야 많이 먹어 응.
아빠는 철따라 산골에서 자라는 꽃이란 꽃은 죄다 뿌리 채 파와서
그 동산에 심어놓고는
혼자 말로 "심심하지 않지"라고 하셨어요.
아빠.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야 ?
응. 응. 여우와 뻐꾸기에게 하는 말이야.
여우는 무섭던데…
뻐꾸기는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야.
엄마도 안 왔는데 말이야.
그 동산 꼭대기에서 우리 집 싸리문 쪽으로는
잔디가 없어지고 그 대신 붉은 흙이 보이는 길다란 길이 났어요.
잔디는 내 엉덩이 썰매에 닳아 없어진 거죠.
아직도 내 엉덩이와………에는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어요.
난 그 상처에 아빠가 발라 준 된장이 너무 따갑고 아파서
동산에 올라가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한 여름밤에는 그 동산의 부드러운 잔디에 엄마가 좋아하던 파란 이불을 펴놓고
하늘의 별을 세며 아빠와 난 잠을 자는데
아빠는 뭐라 뭐라 혼자서 중얼거려요.
아빠 누가 왔어 ?
응. 산에 사는 산신령이 오셨어.
뭐라고 했는데 ?
응………우리 설이 예쁘게 잘 자라도록 해 달라고 했지.
피 이∼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그런데 왜 또 산신령님께 부탁을 하는 거야.
응. 더 예쁘게 자라게 해 달라고.
…호호. 아빠. 고마워요…
동산 주위에 심어진 설앵초가
스물 두 번을 피고 지고…또 피고 지고 하였지만
읍내 장에 과자 사려 가셨던 엄마는
아직도 돌아 오지 않았어요.
아빠, 날 업고 읍내 장에 가자.
왜 에 ?
응. 엄마가 우리 집으로 오는 길을 잃었나 봐.
그래서 우리가 엄마 마중 가야지 응 아빠.
아냐 엄마는…아직 과자를 사지 못해서 늦은 거야.
정말 ? 왜 에 ?
이번 장날에는 과자를 파는 할머니가 오지 않았나 봐.
그래서 다음 장날까지 기다리나 봐.
그러면…그냥…오지…그래도…그냥…오지…
그냥.
올 봄
설앵초의 이 꽃잎이 다 지기 전에
엄마가 돌아 오시면
참
좋겠어요.
임마…엄마 코는 그렇게 뭉툭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 러 음 ?
응. 이렇게 지우고…이렇게 예쁘게…흙을 더 모아서 오뚝하게 그리고
눈도 이렇게 되게 컸다.
그럼 입은 ?
입은 이렇게…앵두처럼 예뻤지.
그…랬…어…
지금
설앵초가
그 슬픈 꽃잎을 다 피우고는
이제 그 꽃잎을 동산에 뿌리면서
…울고…있거든요.
엄마…
과자는…그래도…없어도…그래도…맛있는…아냐…없어도 돼.
내가 이만큼 컸는데 엄마는 아직도 내가 과자를 먹는 줄 알고 있는가 봐요.
그냥…와.
그냥…
아빠…이제 산에서 내려가자 응 ?
왜 에 ?
응…컴도 없고 폰도 없고 비젼도 없고 따르릉도 없고,
형자는 샀니 ?
응.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서울 자취방에 다 있는데 여긴 전기가 없어서 그래.
없어면 사야지. 남들이 다 가졌다면 니도 사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니 엄마한테 혼난단다.
집 뒤에 쌓아 둔 장작을 전부 내다 팔면 살수 있을까 ?
………
그런데 컴이 뭐고 폰이 뭐 하는 게야, 입고 다니는 거야 ?
응………
아빠. 우리 서울 가자. 응 아빠.
………우리가 가고 난 뒤 엄마가 오면………
그럼. 여기 마루에 편지를 써 놓고 가지.
엄마는………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참………그렇지.
엄마, 나 있잖아, 오늘 아빠 목욕시켜 드렸다. 잘했지 잘했지.
마당가 장독대 물항아리 옆에서 웃통을 벗어 부치고 그 우람한 몸을 자랑하며
등물을 하시던 그 건장했던 아빠의 몸도
약하디 약한 내가 두 팔로 번쩍 들어 올려 욕간 통으로 옮기면서
북받치는 울음을 참느라고 깨문 입술에는 붉은 피가 철철 흘렸어.
엄마를 등에 업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밭에서 저 골짜기로
홍길동처럼 날아다니시던
아빠의 그 황소 같은 잔등에는 벼루에 먹을 가는 아이들이 장난을 쳤는지
화려한 사화(死花)가 만발하였고,
나를 앉혀 놓고 청룡열차를 태워 주시던 그 튼튼한 허벅지도
이제 더는 서있지도 못할 만큼 가늘게 후들거리고 있었어.
시도 때도 없이 방에서 마루에서 밭에서 산에서
엄마를 금방이라도 꼴깍꼴깍 숨넘어가게 만들고
엄마의 그 황홀한 신음소리가 온 산골에 울려 퍼지게 만들었든
아빠의 그 화려한 요술방망이도
이제 도시의 리어카 위에서 삶아서 파는 번데기처럼…
오직,
아∼
아빠가 남자였었음만을 말해주는 초라한 형상을 하고 있었어.
엄마.
이것이 아빠의 마지막 목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대로 엄마 곁에 가면 엄마가 씻고 오지 않았다고 투정을 부릴까 봐
엄마가 그처럼 뜨거워서 호호 불어서 먹던 아빠의 그 우람했었을 요술방망이를
씻고 또 씻으면서 난…엄마의 환한 웃음을 그리고 있어.
엄마.
나 잘했지. 그치. 그치.
엄마의 빨간 수건으로 목욕을 마친 아빠의 몸을 닦고 있는데
그 빨간 수건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아빠의 얼굴에는 희미한 웃음이 피어나고 있었어.
엄마.
아빠가 가시면 첫날부터 응응하며 너무 보채지 마.
아빠는 지금 너무 쇠약하시거든.
엄마가 온 산골을 다 뒤져 신선이나 먹는 약초를 다 캐다가
정성을 들여 다려서 아빠에게 드리고
아빠가 비로써 팔뚝에 힘이 생겨 엄마를 살포시 안아주시면
그때…엄마는 살며시 부끄럽게 고쟁이를 벗어야 해. 응 엄마. 알았지.
엄마.
아빠를 업고 동산 앞에 왔어. 엄마 알지 ?
나 아, 방에서 단숨에 아빠를 업고 한번도 쉬지 않고 동산까지 왔다.
엄마. 나 힘세지. 그치.
난 동산에 엎드려 울고 있어요.
엄마. 아빠 좀 어떻게 해 줘요. 저대로 두시면 그냥 가신다…말 이예요.
………
아빠는 엄마 말만 듣잖아. 응 ? 엄마. 아빠 좀 어떻게 해 봐.
의사가 지금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된대.
………
회사 사장님이 아빠를 모셔오면 병원비도 다 대주고
큰 방도 얻어 준다고 했단 말이야. 응.
내 자취방도 아주 커. 아빠와 둘이 살 수 있단 말이야.
………
엄 마 아 ∼
………설아. 아빠는 이 산골에서 태어나셨고……
아빠는 평생 태어나서 버스도 한번 타보지 못했고
천 원짜리와 만 원짜리도 모르고…
내 손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산골에서 떠나지 않아서…겁이 나서…무서워서…
사람들이 사는 곳엔 가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야.
왜 에 ? 내가 엄마 만큼 잘 돌보면 될 거 아냐.
………아빠는 글도 읽지 못하고…사람들을 무서워하니…
그러니 그냥 여기 내 곁에 계시게 하면 안되겠니 ?
아빠는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그리고 나도 곁에 있는
이곳에서 사시게 그냥 둬 응.
아빠와 하루라도 더 같이 살고 싶으면
엄마 말대로 그렇게 해.
내일은 아빠를 업고라도 읍내병원에 갈 거야.
설아.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병원 간다고 나을 병이 아니잖아.
내가 떠나고 난 뒤 아빠도 엄마 따라 오시겠다고
밤마다 투정을 부리시는 걸 스물 두 해나 달래면서
설이 잘 키워서 시집 보내고 난 후에 나한테로 와요 했는데
니가 이만큼 컸으니…많이………사셨지.
싫어, 싫어 그럼 난 혼자가 되는데…싫어 싫어 엄마.
니가 왜 혼자니 ? 아빠가, 엄마가 있는데.
엄 마 아………
엄마. 날………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럼………니 혼자………내려 가거라.
아빠는 ?
응. 아빠는 내가 있는 동산 옆자리에 응. 거기…나무 뚜껑을 들고 열어 봐.
니가 가고 나면…아빠는 엄마 곁에서…거기서 주무실 거야.
그래서 이 골짜기에 아빠의 새벽기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샛골 현이 아빠가 삽을 들고 여기로 올라와서
다…해…주실 거야.
엄마 무서워. 무서워. 그러지 마. 응 엄마.
엄 마 아.
내가 잘못했어. 나 아…안 갈 깨.
가야지…7년이나 걸린 공부도 마저 끝내야 하고…응 설아.
이제 그렇게 고생만 하지말고 저기 저 밭뙈기를
산소자리를 보려온 읍내 고추방아간 사장에게 팔아서 등록금으로 하렴.
그까짓 공부…야간으로 마지막 한학기만 더 때우면 돼.
싫어 가라고 하지 마 엄마. 응.
………가야지………넌………가야지………넌 가야 돼………사람들 속으로…
엄 마 아.
설아.
내일은 읍내 미장원에 다녀 오거라. 여자가 머리가 그게 뭐니 응 ?
산골에 들어 온지 2개월이 되도록 빗질 한번 하지 않는 내 머리가
어깨를 덮고 치렁거리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나 보다.
안 돼. 엄마.
그 사이에 아빠가…
………
설아.
엄마 그만 주무시게 하고 이리 올라 와서 자.
예에. 아빠………그럴 깨요.
아빠를 업고 돌아서는
내 가슴에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다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이
가슴을 후벼파고 다리를 절게 하고 있어요.
엄마.
내일 또 봐.
아빠와 같이 또 올 깨.
팔뚝이 너무 긴 아카시아가
터질 듯한 하얀 수염을 주렁주렁 무겁게 달고
늙은 애비를 내 손으로 엄마 곁에 묻고 산에서 내려가야 하는
이 년의 두려움과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도
신이 나서
봄바람에 춤을 추고 있는
산골에서
설앵초
올림.
●
피치 못할 산골생활이 예정보다 길어질 것 같다는 설앵초님의 메모와 함께
우편으로 온 설앵초님의 다음 작품의 원고를 타이핑 중이므로
곧 올리도록 하겠어요.
대필 및 등록 대행 : (정O영)
◐
붉은미르 : 참~~~ 그냥 그대로. 글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슴으로 이해 해야죠. 빨리 내려오시라는 말도, 계속 있으라는 말도 할 수 없군요.....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2004-06-06
아루지기 : 삶은 언제나 전등 빛이 아닌 촛불입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현란하게 춤을 추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기에 무한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는 전등빛 보다 유한하고 보잘 것 없는 촛불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건지도 모릅니다. 모쪼록 슬픔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19금]레드썬 사이트는 성인컨텐츠가 합법인 미주,일본,호주,유럽 등 한글 사용자들을 위한 성인 전용서비스이며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사이트는의 자료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작권,초상권에 위반되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